
⊙개발사: Memory of God ⊙장르: 어드벤처 ⊙플랫폼: PC, 모바일, 스위치 ⊙발매일: 2019년 2월 8일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하루.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는 이 애매한 시간을, 매일을 버텨내는 게임이다.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The Stillness of the Wind)'는 Lambic Studios와 Memory of God가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무료로 배포되었던 전작 'Where the Goats are'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황무지에 혼자 남은 주인공 탈마가 되어, 밭을 가꾸거나 염소를 키우며 농가와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 사실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는 좋게 표현하자면 잔잔한,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금 지루한 게임이다. 황량한 곳에서 작은 농가를 가꿔나가며 가족들의 소식을 받아보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탈마의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연이어 떠올랐던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전하고자 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생, 매일매일을 견뎌낸다는 것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탈마는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농가를 보살피며 살아간다. 그녀 곁에는 두 마리의 염소뿐, 가족들은 모두 한 명씩 마을을 떠나 도시로 떠나버렸다. 그녀의 하루는 농가를 보살피는 일과로 채워지며, 가끔 전달되는 가족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가 소소한 이벤트가 된다.
앞서 말했듯,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니, 견뎌낸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농가를 보살핀다는 일과가 있지만, 그 속에는 활력이 없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을 기다린다. 대화 없이 보낸 하루하루는 조금씩 모여 조용한 매일이 되고, 고독한 인생이 된다.
'매일'이라는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오래전 친구와 영화관에서 봤던 '에브리데이(2012)'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다큐멘터리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 같은 허구를 만들어내는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의 영화로, 조용한 일상을 다룬다. 주인공 카렌은 매일 힘겨운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따금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만나러 간다.
오, 게임처럼 영화 '에브리데이'도 선뜻 권하기 힘든 작품이다. 긴 시간에 걸쳐 촬영된 작품이라 영화 속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름 즐겁지만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매일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영화에서 프레임으로 잡히는 순간 이벤트를 기대하기 마련이니까.

영화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만나러 교도소에 가는 일이다. 마치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에서 편지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큰 이벤트인 것처럼. 그 외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조금 불안하다.
영화에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카렌의 삶을, 게임에서는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탈마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카렌과 아이들, 그리고 남편과의 거리감은 탈마와 도시에 사는 그녀의 가족 간의 거리감과 비슷하게 다가온다. 그들 모두 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다 다르다. 교도소에서의 재회와 게임에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특별한 이벤트'는 각자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잠시 만나는 순간이기에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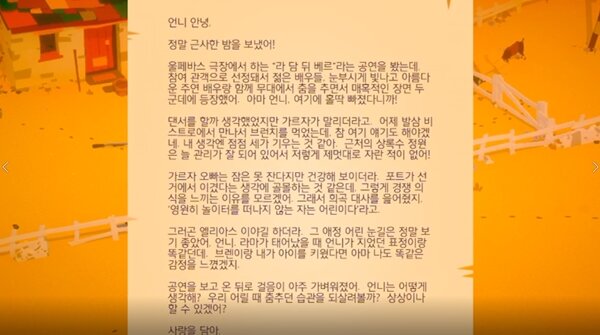
두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무엇을 가족이 가족답게 만들어주는가. 관계, 혹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정은 매일매일을 함께 공유하면서 끈끈해진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면서 카렌의 부부 관계는 비틀어지고, 탈마의 삶은 고독함으로 채워진다.
감동을 느끼는 것도 타이밍이 맞아야한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지만,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느리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탈마의 속도를 인내하는 것도 힘들고, 정해진 일과를 하고 나서 조금씩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다. 한 번씩 찾아오는 상인 겸 편지 배달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느린 것은 움직임뿐만이 아니다. 엔딩을 보기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느린 전개도 괴롭다. 텃밭을 가꾸고 치즈를 만들고 물건을 사고, 해야 할 요소들은 있지만, 성취감도, 변화도 미미하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과는 핵심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전개가 너무 느리다. 엔딩까지는 한 세 시간 정도 걸렸다.
전개가 느리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엔딩에서 분명히 받아야 했을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없게 만든다. 분명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엔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지루해서 덤덤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이다. 중간 과정들이 추억을 만들고 애정을 갖게 만들어 엔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기쁨이나 슬픔, 감동을 느껴야하는데, 반대로 방해만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엔딩을 봤을 때의 감정은 '아, 드디어 끝났네.' 정도였다.
조금 식상한 멘트기는 하지만, 인생은, 사랑은, 운명은, 성공은 타이밍이라고들 한다. 정확한 순간에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거다. 게임과 영화도 똑같다. 슬픔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는 것도 모두 타이밍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는 그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았던 것이 아닐까. 게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엔딩이 줬을법한 감정까지, 모두 머리로 '이해'만 되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느려서 불편하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느려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연출에는 모든 것이 고려된다. 어느 부분에서 장면을 커트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전달할 것인지, 주인공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탈마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를 그대로 고수해야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주던가, 전체적으로 연출 부분을 늘려 엔딩까지 가는 여정을 지루하지 않게 하던가. 특히 빠른 속도에 익숙한 현대인이 타겟층인만큼 좀 더 많은 고민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가 빨랐던가 게임이 느렸던가. 느린 탈마의 시간과 빠르게 지나가는 현실 속 나의 시간.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더라도 '스틸니스 오브 더 윈드'의 타이밍이 내 감정의 시간과 맞아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