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게임기자로서 썩 좋은 자세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산 게임은 부분유료화를 택하고 있지 않던가. 이쪽 업계엔 강력한 과금 괴물들이나 했다 하면 서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진성 코어 게이머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한때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옆자리 기자고 앞자리 기자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않고 지르는 마당에 과금을 싫어하는 내가 기자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결론은, 태생적으로 도박이나 확률을 싫어해 로또조차 하지 않는 나에게 국내 게임시장은 물건만 많고 살 것은 없는 시장이었다. 간혹 마음에 드는 게임이 생겨도 과금 요소를 보면 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걸 하려면 게임 셋 정도는 포기해야 할 판이었으니 말이다.

최근 시작한 게임 하나도 사실 비슷하다. 국산 게임은 아니고 '스팀'에서 꽤 오래 서비스된 게임이다. 부분 유료화에 기본적으로는 무료 게임. 게임 내 콘텐츠는 전부 공짜로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료 재화를 통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 타임세이버이지만, 뜻밖에 유료 재화를 쓸 수 있는 구석이 많다. 쉽게 말해 귀찮은 건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시간 좀 들이면 사실 없어도 되는 일이지만.
12월 말부터 1월까지는 굵직한 라인업이 비는 시기라 그냥 시간이나 때울까 하고 시작한 건데 의외로 재밌어서 꽤 열심히 하다 보니 자꾸 유료 재화 구매 탭에 손이 간다. 아마 아예 모르고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몇천 시간을 먼저 한 동생이 그 유료 재화를 몇 번 퍼줘서(희한하게 직거래가 된다.) 편하게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버렸나 보다. 느긋하게 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자꾸 구매 탭으로 마우스가 가는 게 느껴진다.
그러다 결국 질러버렸다. 눈 딱 감고 5만 원만 써야지 하고 지르고 나니 이상하게 후회보단 만족감이 든다. 그렇게 산 재화는 생각보다 금방 써버렸지만, 그래도 '헛돈 썼다'하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지를만했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게임을 사는 비용 말고 추가 지출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던 게이머인데, 과금한 후에도 만족감이 남는다.
'착한 과금'이라는 워딩이 생각난 게 이쯤이었다. 간혹 개발자 인터뷰를 가거나 게임 소개문을 보면 '착한 과금', '착한 BM'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적게 쓰게 만들거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과금을 말할 때 쓰이곤 했다. 하지만 과금 과정을 직접 겪으며 생각해보니, '착한 과금'은 개발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사는 게이머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만족감'이다.
내가 국산 게임들의 과금을 싫어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국산 게임, 특히 모바일게임은 대부분 내가 과금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같은 돈을 쓰고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올지, 쓰레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부담감이 과금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다.
보다 디테일하게 가면,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이유다. 만약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비싸게 내더라도 확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택할 것이다. 나 같은 스타일의 게이머는 그냥 그 '불확실성'이 싫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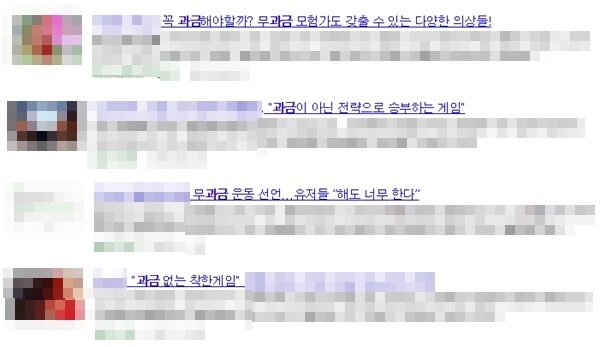
디테일이 아닌 근본으로 다가서면, 내가 만족했던 그 게임(대충 눈치챈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가 될 수는 없으니)은 소비자(게이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딱 귀찮을 만하면 '요거 300원만 내면 되는데' 라면서 나오는 것이다.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이게 없다고 내 캐릭터가 망하고 그런 것도 없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건 귀찮음을 줄이거나,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멋진 이른바 '간지템' 정도인데 불쾌할 일이 전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국산 게임도 이렇게만 해줬으면 게임 플레이는 물론이고 적당한 지름도 함께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놈의 확률형이 발을 잡고, 기간제가 목덜미를 잡아끌어 버리니 늘 망설이게 되고, 딱 일에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되어버린다. 내가 말하던 그 게임과 국내 게임들의 차이라면 이건 그래도 7~8년 서비스된 게임이고 그만큼 쌓인 콘텐츠가 병렬형으로 매우 많다는 정도인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들은 몇 년을 서비스해도 계속 확률형 아이템이 나오지 않던가.
자율 규제니, 확률형 아이템의 법리적 해석 같은 어려운 방법의 이야기 말고, 게이머와 개발사를 1:1로 두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방법으로도 당연히 수익은 거둘 수 있다. 모든 게이머가 나와 같은 건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다수 게이머가 원하는게 확률형은 아니지 않은가?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다. 살 게 그것뿐이라 그런 거지.
'착한 과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저 게이머가 원하는 상품이 적절한 가격대에 존재하기만 해도, 상품을 구매한 게이머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착한 과금'은 완성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게 불가능한 경우는 게이머가 원하는 상품이 없거나, 그렇게 소모하기엔 콘텐츠가 부족한 경우인데, 이건 자신 있는 부분 아니던가. 요즘 어떤 게임을 봐도 풍부한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던데 아마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주절주절 쓰다 보니 속마음이 그대로 나온다. 한국인이면서 게임기자인데 국산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 게임 스펙트럼은 나조차도 걱정되는 일이다. 간혹 편집장님이 '너는 국산 게임도 좀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내심 찔리면서도 '네...' 라고 시무룩하게 대답하곤 했는데, 이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무과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 또한 성격 급하고 강해지고 싶은 생각은 있는 한국인이다. 그냥 그 과정을 밟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 알아서 마음을 접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확률형 갑자기 다 빼라 할 수도 없고, 기업의 수익 창출 방법을 가지고 내가 뭐라 할 깜냥도 아니니 게이머가 진짜 원하는 상품을 적절한 가격대에 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좋다. 그리고 아마,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가 함께 해결될 테다. 게이머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니 게이머와 개발사 간의 갈등도 줄어들 테고, 늘 주홍글씨처럼 따라붙는 '사행성' 딱지도 어느 정도는 떼넬 수 있을 테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뭇거리며 말해야 했던 '착한 과금'이 진짜로 만들어진 것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