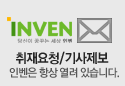게임의 제목은 'Into the Dead',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모두에서 플레이해볼 수 있다. 제목과 게임플레이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임도 오랜만이다. 결국은 죽어야 하니 미친듯이 달려봤자 죽음을 향해 달릴 뿐 아닌가. 아 이거야말로 인생의 진리가 아니던가. 그야말로 "미친듯이 달리는 게임"이다.


게임을 시작하면 좀비들이 떼로 몰려온다. 어둡고 흐린 밤, 드넓은 들판을 미친듯이 달리면서 발에 걷어채이는 녹색 박스를 주워 무기를 장착해 좀비를 죽여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신에게 탈출은 허락되지 않는다. 아무리 멀리 간들 좀비들은 점점 많아지고, 총이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뿐.
좀비물 분위기 물씬 풍기는 게임인 'Into the Dead', 그 흔한 배경음악 하나 없이 효과음만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릴이 넘치는 효과가 있다. 들판을 달리다가 옥수수밭으로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저 달릴 뿐이다. 주인공은 좀비에게 먹히는 걸 보면 인간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몇 km를 전속력으로 뛰는지는 의문이지만...
정신없이 3km쯤 달려갔을 때 마침 전화가 오는 바람에(광고전화였다, 매우 극렬한 분노를..) 게임을 멈추고 나서 잠시 한 숨 돌렸다. 커피 한 모금 다시 넘기며 든 생각. 사실 좀비퇴치 게임이라고 하면 FPS가 주된 장르인데, 이 게임은 흔히 말하는 러닝게임이다. 러닝게임? 점프나 슬라이드 정도의 조작말고는 할 일 없는 그 러닝게임? 이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러닝게임의 형태를 따오고 있다.
러닝게임의 특징을 꼽는다면, ▲'달린다', ▲'장애물을 피한다', ▲'최대한 멀리 간다' 정도일 것이다. 'Into the Dead'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러닝게임'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기존의 이미지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픽과 설정, 느낌을 주는 게임이다.
강남역에서 백 명쯤 붙들고 핸드폰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쿠키런이나 윈드러너 중 하나쯤 안 깔려있는 분이 있을까. 그만큼 인기있는 장르지만 신작 러닝게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왜일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마켓 차트에서 러닝게임만 놓고 보면 사실 그래픽만 바뀌었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가. 횡스크롤 방식에 점프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끝없이 뛰어가는 그런 게임. 차별화 없는 게임의 향연, 지겨울 수 밖에 없다.
'Into the Dead'도 본질은 러닝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이 윈드러너나 쿠키런의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방식이나 규칙은 똑같은데 왜 유저들은 이 게임을 새롭다거나 재미있다고 느낄까? 해답은 아이디어와 포맷의 차이에 있다.
'자동으로 달려가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은 러닝게임의 장르적 특성이다. 하지만 횡스크롤이라든지 조작 방식, 맵 디자인 등은 게임의 포맷이다.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표절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포맷까지 일치한다면 비슷한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Into the Dead'는 러닝게임이라는 한 장르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러닝게임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1인칭 시점으로 달려가게 되며 랜덤으로 나오는 무기들을 이용해 적을 퇴치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맵은 물론 좀비라는 소재에 어울리는 공포감까지 갖췄다. 해볼만한 게임이다. 러닝게임이라는 장르 안에서의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접목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피카소는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말했다.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에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 매킨토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로 거듭난 음악가, 화가, 시인, 동물학자, 역사가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에 과감하라. 요즘 같이 카피캣 논란이 뜨거운 때에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비난받기 딱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애플의 CEO,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였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게임은 아이디어를 잘 훔친 게임이다. 기나긴 게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등장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였던 '명작' 게임은 사실 몇개 되지 않는다. 만약 완벽히 새로운 게임들만 인정받는다면 게임업계는 산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차용과 단순한 모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저들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재미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꼭 장르의 혁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OS처럼 새로운 장르의 출현도 필요하지만, 게임의 세부적인 재미 요소를 꼼꼼히 캐치해서 다른 시점으로 펼쳐보인다면 유저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한 장르의 게임이 성공하면 얼마 지나지않아 비슷한 형태의 게임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장르라고 해도 게임 플레이나 여타 세부적인 요소들에서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다면, 즉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유저들에게 호평받는 게임이 될 수 있다.
비슷한 게임들만 계속 출시되면서 새로운 재미를 원하는 게이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Into the Dead'는 아이디어를 잘 훔치면 같은 장르 속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이 태어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