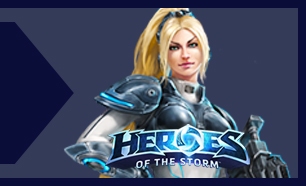...м–ҙлЁёлӢҲлҠ” лӢ№мӢ мқҙ лҠҳ к·ёлҹ¬н•ҳм…Ёл“Ҝ кёҒм–ҙлӘЁмңјлҠ” лІ•ліҙлӢӨлҠ” мқҙлҜё мҘ” кІғмқ„ лҚ” кҪү мҘҗлҠ” лІ•мқ„ л°°мҡ°лқјкі к·Җк°Җ л”°к°‘лҸ„лЎқ л§җм”Җн•ҳм…Ём§Җл§Ң, н—Ҳ기진 л°°к°Җ лӮҙлҠ” кј¬лҘҙлҘө мҶҢлҰ¬лӮҳ лЁј м„ м°©мһҘм—җм„ң н’ҚкІЁмҳӨлҠ” мӢңнҒјн•ҳкі л№„лҰҝн•ң лғ„мғҲ лҚ•м—җ лӮҳлҠ” к·ёкұё м§ҖкІЁмҡҙ мһ”мҶҢлҰ¬ м •лҸ„лЎң м№ҳл¶Җн•ҳкі нқҳл Өл“ЈкіӨ н–ҲлӢӨ. к·ёлҹјм—җлҸ„ м–ҙлЁёлӢҲлҠ” лӮҳлҘј лҒ”м°ҚмқҙлҸ„ мӮ¬лһ‘н•ҳм…Ёкі , к·ёкұё мҰқлӘ…мқҙлқјлҸ„ н•ҳл ӨлҠ” кІғмІҳлҹј мҳЁ л§Ҳмқ„мқҳ 골칫кұ°лҰ¬мҳҖлҚҳ нҳ•мқҖ м•„лһ‘кіін•ҳм§Җ м•Ҡкі мҳӨм§Ғ лӮҳл§Ңмқ„ к°җмӢёкі лҸ„м…ЁлӢӨ. к·ёкІғмқҖ м–ҙм©Ңл©ҙ лӮҙк°Җ мһ‘мӮҙкіөмқҙм—ҲлҚҳ м•„лІ„м§Җмқҳ л’ӨлҘј мқҙм–ҙ мҳЁ к°ҖмЎұмқ„ лЁ№м—¬ мӮҙлҰ¬кёё л°”лқјлҠ” л¬ҙмқҳмӢқм Ғмқё мғқмЎҙ ліёлҠҘмқҳ л°ңнҳ„мқј мҲҳлҸ„ мһҲм—ҲкІ м§Җл§Ң, лҚ•л¶„м—җ л§Ҳмқ„мқҳ лӢӨлҘё мһҗмқҙкёҖлЎңмҠӨ м–ҙлҘёл“Ө лҳҗн•ң лӮҙкІҢл§ҢмқҖ н•ӯмғҒ мӮҙк°Җмӣ кі лӢӨм •н–ҲлӢӨ.В
нҳ•мқҖ мІңмғқ л°ҳкіЁмқҙм—ҲлӢӨ. лӮҙк°Җ к°“ м –мқ„ л—җмқ„ л¬ҙл өл¶Җн„° м•„лІ„м§ҖлҘј лҸ„мҡ°лҹ¬ мһ‘м—…мӢӨмқ„ л“ӨлқҪкұ°л ёлӢӨкіӨ н•ҳм§Җл§Ң, лӘҮ мЈјлҸ„ м•Ҳ лҗҳм–ҙ лӮҳк°Җл–Ём–ҙмЎҢлӢӨкі н–ҲлӢӨ. мһ¬лҜёк°Җ м—ҶлӢӨлӮҳ. м§ҖкёҲ мғқк°Ғн•ҙлҸ„ мӣғкёҙ л§җмқҙлӢӨ. нҳ№мӢң мқҙнӢҖн•ҳкі лҸ„ л°ҳ лӮҳм Ҳмқҙ л„ҳлҸ„лЎқ кө¶м–ҙ ліё м Ғмқҙ мһҲлҠ”к°Җ? л°°к°Җ м§ҖлҸ…н•ҳкІҢ м“°лҰ¬кі нғңмғқмқҙ м„ұл§ҲлҘё мӮ¬лһҢмІҳлҹј мҳЁк°– мӮ¬мҶҢн•ң кІғм—җлҸ„ м§ңмҰқмқ„ лӮҙкІҢ лҗңлӢӨ. к·ёлҹҙ л•Ң лҲ„кө¬л“ л§ҲмЈјм№ҳлҠ” мӮ¬лһҢн•ңн…Ң лӢ¬л Өл“Өм–ҙ лӢӨм§ңкі м§ң мЈјлЁ№м§Ҳн•ҙлҢҖлҠ” кұҙ мЎ°кёҲ мһ¬лҜёк°Җ мһҲмқ„м§ҖлҸ„ лӘЁлҘҙкІ лӢӨ. к·ёлҹҙ нһҳмқҙ лӮЁм•„мһҲлӢӨл©ҙ л§җмқҙм§Җ.В
нҳ•мқҖ к·ёлҹ° мў…лҘҳмқҳ мһ¬лҜё лҢҖмӢ лҚң л°°кі н”Ҳ мӘҪмқ„ нғқн–ҲлӢӨ. лӮҙк°Җ н’Җл¬ҙм§Ҳ н•ҳлҠ” лІ•мқ„ мІҳмқҢмңјлЎң л°°мӣ лҚҳ лӮ , нҳ•мқҖ лҠҰмқҖ м Җл…Ғ мҸҹм•„м§ҖлҠ” 비лҘј мһ”лң© л§һкі мҷҖм„ңлҠ” лӮңлЎң мҳҶ л‘Ҙк·ј нғҒмһҗ мң„м—җ л°”лӢӨлұҖ мқҖнҷ”лҘј лӯүн……мқҙлЎң лӮҙл ӨлҶЁлӢӨ. мӢқмӮ¬лҘј к°Җм ёк°Җл Өкі мһ мӢң кұ°мӢӨлЎң мҳ¬лқјмҷ”лҚҳ лӮҳлҠ” мқҖнҷ” лҚ”лҜёк°Җ л°ңн•ҳлҠ” мғқкІҪн•ң кҙ‘мұ„лҘј л¬јлҒ„лҹ¬лҜё л°”лқјліҙлӢӨк°Җ л¬ёк°„м—җм„ң л¶Җмё м—җ 묻мқҖ нқҷмқ„ н„°лҠ” нҳ•мқҳ мІңм—°лҚ•мҠӨлҹ¬мҡҙ лҜёмҶҢм—җ м–ҙмғүн•ҳкІҢ мһ…кј¬лҰ¬лҘј 추м–ҙмҳ¬лҰ¬кіӨ, лӢӨмӢң мһ‘м—…мӢӨлЎң мў…мў…кұёмқҢмқ„ міӨлӢӨ. мўҖмқҙ мҸң нқ”м Ғмқҙ кө°лҚ°кө°лҚ° лӮЁмқҖ лӮҳл¬ҙ кі„лӢЁмқ„ лӮҙл Өк°ҖлҚҳ мӨ‘м—җ, мң„мӘҪм—җм„ң м–ҙлЁёлӢҲк°Җ кі н•Ём№ҳлҠ” кІҢ л“Өл ёлӢӨ. нҳ№мһҗлҠ” л№Ңм§ҖмӣҢн„° кј¬л§Ҳл“ӨмқҖ м „л¶Җ мҳҒм•…н•ҳкі м•Ң кІғ лӢӨ м•ҲлӢӨкі л§җн• м§Җ лӘ°лқјлҸ„, к·ёл•Ң лӮҳлҠ” к·ёлғҘ мҲң진н•ң лӮЁмһҗм• мҳҖлӢӨ. лӮҙкІҢ мқҙ м„ёмғҒм—җм„ң к°ҖмһҘ мӮ¬лһ‘н•ҳлҠ” м„ё мӮ¬лһҢ мӨ‘ л‘җ лӘ…мқҙ лҢҖкұ°лҰ¬н•ҳлҠ” мҶҢлҰ¬мҷҖ л°ҳм§қмқҙлҠ” лҸҷм „ л¬ҙлҚ”кё° мӮ¬мқҙм—җ лӘЁмў…мқҳ кҙҖкі„к°Җ мһҲмқ„ кұ°лқјкі мғқк°Ғн• лҠҘл Ҙ к°ҷмқҖ кұҙ лӢ№м—°нһҲ м—Ҷм—ҲлӢӨ. лӘҮ лІҲмқёк°Җ мӮ¬лғҘ лҸ„кө¬лҘј кұ°лһҳн•ҳлҹ¬ м•„лІ„м§ҖлҘј л”°лқјк°Җ лҙӨлҚҳ л¶Җл‘Јк°Җм—җм„ң л§Ўм•ҳлҚҳ л¶ҲмҫҢн•ҳкі мҢүмҢҖн•ң лғ„мғҲл§Ңмқҙ л№—л¬ј лӮҙмқҢмқ„ лҡ«кі мҪ”лҘј к°„м§ҖлҹҪнҳ”лҚҳ кІғл§Ңмқ„ лҠҗкјҲмқ„ лҝҗмқҙлӢӨ.В
к·ё мқјмқҙ мһҲм—ҲлҚҳ мқҙнӣ„лЎң, нҳ•мқҖ лӮҙкІҢ м—¬м „нһҲ мӮҙк°‘кі мқөмӮҙл§һм•ҳм§Җл§Ң 집м—җ л¶ҷм–ҙмһҲлҠ” мӢңк°„мқҙ м җм җ м Ғм–ҙмЎҢкі л¶ҖлӘЁлӢҳмқҖ л¬јлЎ лӢӨлҘё м–ҙлҘёл“ӨкіјлҸ„ мўҖмІҙ л§җмқ„ м„һлҠ” мқјмқҙ м—Ҷм—ҲлӢӨ. к°ҖлҒ” мһҗмқҙкёҖлЎңмҠӨ лҢҖмһҘк°„мқҙ мү¬лҠ” лӮ мқҙл©ҙ нҳ•мқҖ м–ҙлЁёлӢҲ лӘ°лһҳ лӮҳлҘј лҚ°лҰ¬кі л°ұмғү м„ м°©мһҘ к·јмІҳм—җ мһҲлҠ” лӮЎмқҖ лӘ©мһ¬ м°Ҫкі лЎң лҶҖлҹ¬ к°”лӢӨ. лҢҖл¶Җ분мқҳ кіөк°„мқҖ 묶мқё нҢҗмһҗ лҚ”лҜёл“Өкіј лӮҳл¬ҙнҶө, м—°мһҘ м„ л°ҳ л“ұмңјлЎң л“Өм–ҙм°Ё мһҲм—Ҳм§Җл§Ң м•ҲмӘҪмңјлЎң мЎ°кёҲ лҚ” л“Өм–ҙк°Җл©ҙ мӢӯмҲҳ лӘ…мқҖ л„ҲлҒҲнһҲ лҲ„мҡё мҲҳ мһҲлҠ” м•„лҠ‘н•ң кіөк°„мқҙ мһҲм—ҲлӢӨ. нҳ•мқҖ к·ёкіім—җм„ң лӮҙкІҢ лһЁмң… нҳёмқҳ 비лӢЁлұҖ мӮ¬лғҘмқҙлӮҳ л¶Җл‘җ мҘҗм—җ кҙҖн•ң кҙҙлӢҙ, мҳ¬к°ҖлҜёмҷҖ к°Ҳкі лҰ¬ м“°лҠ” л°©лІ• к°ҷмқҖ м–ҳкё°лҘј лҒқлҸ„ м—Ҷмқҙ л“Өл ӨмӨ¬лӢӨ. м§җмһ‘н•ҳкұҙлҢҖ к·ёкІғмқҖ нҳ• лӮҳлҰ„мқҳ 'л©Җм–ҙм§Ҳ мӨҖ비' мҳҖмқ„ кІғмқҙлӢӨ. лӮҙк°Җ мҡ°лҰ¬ нҳ•м ңлҠ” м–ём ңк№Ңм§Җкі м„ңлЎңмқҳ мҳҶмқ„ м§ҖнӮ¬ кІғмқҙлқјкі мғқк°Ғн–ҲлҚҳ кІғмқҖ лі„к°ңмқҳ л¬ём ңлӢӨ.В
"...к·ё л’ӨлЎңлҠ” лӯҗ, м„ңлЎң м°ҫм•„ліҙлҠ” мқјлҸ„ лңён•ҙм§Җкі лҚ°л©ҙлҚ°л©ҙн•ң мӮ¬мқҙ лӢӨ лҗҗм§Җ. мӣҗ, мқҙлһҳм„ң мҲ мқҖ м•Ҳ лҗңлӢӨлӢҲк№Ң. л„Ҳм Җ분н•ң л„Ӣл‘җлҰ¬ кө°л§җ м—Ҷмқҙ л“Өм–ҙмӨҳм„ң кі л§ҷмҶҢ."
м§ҖлҸ…нһҲлҸ„ мҷҒмһҗм§Җк»„н•ң мҲ 집мқҙм—Ҳм§Җл§Ң л‘ҳ мӮ¬мқҙм—җлҠ” лҳҗл ·н•ң м •м Ғмқҙ нқҳл ҖлӢӨ. мЎ°н”„н•ҳмқҙл“ңлҠ” н…Ңмқҙлё” л°ҳлҢҖнҺём—җ м•үм•„ 축축н•ң к¶җл Ёк°‘мқ„ лҒҠмһ„м—Ҷмқҙ л§Ңм§Җмһ‘кұ°лҰ¬лҚҳ м—¬мһҗлҘј м§ҖкёӢмқҙ л°”лқјлҙӨлӢӨ. лӮҙлҰ¬к№җ мӢңм„ л„ҲлЁёлЎң м—ҝліҙмқҙлҠ” м§ҷмқҖ к°Ҳмғү лҲҲлҸҷмһҗм—җлҠ” мқҙмғҒн•ҳкІҢлҸ„ лҜём•Ҳн•ЁмқҙлӮҳ лҸҷм •мӢ¬м—җ к°Җк№Ңмҡҙ к°җм •мқҙ м„Өн•Ҹ м–ҙлҰ° л“Ҝн–ҲлӢӨ. 진н•ң м Ғмғү лЁёлҰ¬м№ҙлқҪмқҖ кҪү 묶м–ҙ мҳӨлҘёмӘҪ м–ҙк№Ёл„ҲлЁёлЎң л„ҳкІјлӢӨ. лЁёлҰ¬ л№ӣк№”кіј 비мҠ·н•ң мғүмқҳ мҡ°мқҳ мҶҢл§Ө л°–мңјлЎңлҠ” к°ҖлҠҳм§Җл§Ң лӢӨл¶Җ진 мҶҗлӘ©мқҙ л°ҳмҜӨ мӮҗм ёлӮҳмҷҖ мһҲм—ҲлӢӨ. нқ° мҶҗк°ҖлқҪмқҖ мІҷ ліҙкё°м—җлҠ” к°Җлғҳн”„кі л§ӨлҒ„лҹ¬мӣ м§Җл§Ң, м–‘мӘҪ кІҖм§Җ л§Ҳл””к°Җ лҲҲм—җ лқ„кІҢ кұ°м№ м—ҲлӢӨ.В В
"мҙқмқ„ мўҖ лӢӨлЈЁмӢңлӮҳ ліёлҚ°?"
м—¬мһҗлҠ” к¶җл Ёмқ„ н•ҳлӮҳ кәјлӮҙ мҠ¬л©°мӢң л¬јл ӨлӢӨ мқҙлӮҙ лҸ„лЎң лӮҙл ӨлҶЁлӢӨ.В
"мЎ°кёҲмқҙ м•„лӢҲм§Җ."
м·Ёкё°к°Җ нҷ• к°ҖмӢңлҠ” л“Ҝн–ҲлӢӨ. мЎ°н”„н•ҳмқҙл“ңлҠ” м•Ң мҲҳ м—ҶлҠ” л¶Ҳм•Ҳк°җмқҙ л“ұкіЁмқ„ нғҖкі лӮҙл ӨмҳӨлҠ” кІғмқ„ лҠҗкјҲлӢӨ. мҳҶ н…Ңмқҙлё”м—җ м•үмқҖ мқёк°„л“Өмқҙ мӢӨмқҖ мқҙ м—¬мһҗмҷҖ н•ңнҶөмҶҚмқё лӮ к°•лҸ„л“Өмқҙлқјкұ°лӮҳ н•ҳлҠ” 충분нһҲ мһҲмқ„ лІ•н•ң к°ҖлҠҘм„ұм—җ лҢҖн•ң л¶Ҳм•ҲмқҖ м•„лӢҲм—ҲлӢӨ. к·ёкІғліҙлӢӨ нӣЁм”¬ лҚ” м–јнҶ лӢ№нҶ м•ҠмқҖ л¬ҙм–ёк°Җк°Җ мһҲмңјлҰ¬лқјлҠ”, л§үм—°н•ҳм§Җл§Ң ліёлҠҘм Ғмқё л‘җл ӨмӣҖмқҙм—ҲлӢӨ. к·ёлҠ” м–ҙлҰ° м§ҖнҒ¬л¬ёнҠё мһҗмқҙкёҖлЎңмҠӨк°Җ л№—мҶҚмқ„ лҡ«кі к°Җм ёмҳЁ л°”лӢӨлұҖ мқҖнҷ”м—җм„ң л§Ўм•ҳлҚҳ м°қм°”н•ң н”ј лғ„мғҲлҘј лӮҜм„ м—¬мһҗм—җкІҢм„ң лӘҮмӢӯ л…„ л§Ңм—җ лӢӨмӢң л§Ўкі мһҲм—ҲлӢӨ. к·ёлҠ” м•„лІ„м§Җм—җкІҢм„ң м–ём к°Җ л“Өм—ҲлҚҳ л№Ңм§ҖмӣҢн„° кІ©м–ё н•ҳлӮҳлҘј мғқк°Ғн•ҙлӮҙкі мһҗмӢ лҸ„ лӘЁлҘҙкІҢ лӮҙлұүм—ҲлӢӨ.
"л№Ңм§ҖмӣҢн„°мқҳ мһ‘мӮҙкіөл“ӨмқҖ..."
мЎ°н”„н•ҳмқҙл“ңк°Җ л§җмқ„ лҜёмІҳ мһҮм§Җ лӘ»н•ҳлҠ” мӮ¬мқҙм—җ, м—¬мһҗк°Җ мІңмІңнһҲ мқјм–ҙм„ңл©° мҡ°мқҳ м•һмӘҪ л§Өл“ӯмқ„ лҒ„лҘҙлҚ”лӢҲ н’Ҳм—җм„ң лҲ…лҲ…н•ҙ진 мў…мқҙлҘј кәјлӮҙ к·ёмқҳ м•һм—җ нҲӯ лҚҳмЎҢлӢӨ. м•„л¬ҙлҰ¬ мһ‘м—…мӢӨм—җ нӢҖм–ҙл°•нҳҖ м§ҖлӮҙлҠ” к·ёлқјкі н•ҙлҸ„ нҳ„мғҒкёҲ кІҢмӢңнҢҗм—җ л¶ҷлҠ” мў…мқҙк°Җ м–ҙл–Ө мў…лҘҳмқём§ҖлҠ” м•Ңкі мһҲм—ҲлӢӨ. к·ёлҠ” лҸҢл°ң н–үлҸҷмқ„ н•ҳм§Җ м•Ҡмңјл Ө м• м“°л©° м№Ём°©н•ҳкІҢ мў…мқҙлҘј нҺҙкё° мӢңмһ‘н–ҲлӢӨ. м—¬мһҗлҠ” л¬ҙлҜёкұҙмЎ°н•ң лӘ©мҶҢлҰ¬лЎң л§җн–ҲлӢӨ.
"лӢ№мӢ лҸ„ к°ҷмқҖ мӢқмңјлЎң мІҳлҰ¬н• мғқк°Ғмқҙм—Ҳм–ҙ."
к·ёлҠ” м җм җ мӢ¬н•ҙм§ҖлҠ” л‘җ мҶҗмқҳ л–ЁлҰјмқ„ к°„мӢ нһҲ кІ¬лҺҢлӮҙл©ҙм„ң мў…мқҙлҘј н•ң лІҲ лҚ” нҸҲлӢӨ.
"лҢҖмӢ л°Ҙк°’мңјлЎң м№ҳмһҗкі . к·ёлҰ¬кі ..."
м—¬мһҗлҠ” нқҗлҰ¬л©ҚлҚ©н•ң лҲҲмқ„ н•ҳкі м•„м§Ғ м Ҳл°ҳ нҒ¬кё°лЎң м ‘нһҢ мҲҳл°°м§ҖлҘј л¶Җм—¬мһЎмқҖ мЎ°н”„н•ҳмқҙл“ңмқҳ к·Җм—җ мҶҚмӮӯмқҙкі лҠ” л– лӮ¬лӢӨ.
"л№Ңм§ҖмӣҢн„°мқҳ лҢҖмһҘмһҘмқҙл“ӨмқҖ н”ј лғ„мғҲлҘј л§Ўмқ„ мқјмқҙ м—Ҷм§Җ."
 wheresmyown
wheresmyown